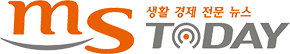식생활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초중등 학교 학생들이 소풍을 가거나 행사가 있을 때 점심으로 선호하는 것이 김밥이다. 김밥 안에 들어가는 반찬은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단무지와 시금치, 소시지 등이 기본이 되어 김밥을 구성한다. 요즘 김밥 전문점에 가보면 정말 놀랄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김밥이 있다. 그만큼 김밥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바다에서 채취한 김을 민물로 깨끗이 씻은 뒤 그것을 잘게 잘라 물통에 넣어서 풀어놓는다. 그렇게 풀어놓은 것을 대나무로 만든 발(김발장, 발장)에 얇게 펼쳐지도록 뿌려서(혹은 떠서) 건조한다. 이렇게 건조된 김을 모아서 우리가 먹는 김의 형태로 잘라서 묶는다. 발장에 뿌려서 얇게 만드는 방식이 언제 개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론이 없는 것 같다. 다만 만드는 방식이 닥나무를 끓여서 종이를 뜨는 방식과 비슷해서 그 이후에 개발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로 알려진 이익(李瀷, 1681~1763)은 ‘성호사설’(권5)에서 김을 언급하면서, “바다 바위 위에 돋는 이끼로서 빛깔은 붉은데, 그것을 따서 마치 종이처럼 조각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붉은빛이라서 자채(紫菜)라고도 하는 김을 채취하여 얇게 만드는 방식이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의 실학자 유득공(柳得恭, 1749~?) 역시 자신이 쓴 ‘고운당필기(古芸堂筆記)’(권4)에서 ‘바다의 이끼’ 두 종류를 소개하고 있다. 하나는 해의(海衣) 즉 김이고 다른 하나는 태포(苔脯) 혹은 파라(叵羅)라고 하는 것인데 파래를 지칭한다. 그중에서 김에 대해서는 이렇게 덧붙인다. “바다에서 건져 볕에 말려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서 불에 구워 먹는데 맛이 매우 좋다.”
조선 후기 관료 문인인 이의봉(李義鳳, 1733~1801)은 1760년 청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경험을 ‘북원록(北轅錄)’에 남겼는데, 거기서 “기름과 간장을 먹이고 햇볕에 말린 김”을 물과 함께 먹었다고 적었다. 이런 기록들이 조선 후기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양식한 김을 채취해서 발장에 말린 김을 먹는 방식이 널리 퍼져있었던 것 같다. 또한, 김을 불에 구워서 먹기도 하고 기름과 간장을 발라서 짭짤하게 먹기도 하는 등 지금 우리가 즐기는 김 조리 방식이 이미 이 시대에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허균 역시 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도문대작’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해의(海衣). 남해에서도 나지만, 동해 사람들이 주먹으로 짜서 말린 것이 가장 좋다.”

여기서 ‘해의’는 바다의 이끼라는 뜻이다. 최근 널리 사용되는 해태(海苔)도 같은 뜻이지만, 근대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던 용어다. 어떻든, 위에서 인용한 허균의 서술은 두 가지 점에서 흥미롭다. 우선 그가 경험한 김은 남해에서도 생산되지만, 동해의 것이 더 맛있다고 했다. 현재 완도를 중심으로 남해가 주산지인 김을 생각할 때 동해의 김은 독특하게 보인다. 그러나 조선 전기를 반영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토산물을 살펴보면 충청도의 서해안 지역, 고성과 거제, 나주 등을 포괄하는 경상도 및 전라도 남해안 지역에 특산물로 김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지역은 동해안이다. 강원도 간성, 강릉을 시작으로 경상도 평해, 울진, 울산, 동래, 영일 등 동해안 전 지역에서 김이 특산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이 편찬한 ‘동국여지지’에는 충청도 서해안 지역에서만 특산물로 기록되어 있는 것과 크게 비교가 된다. 그러므로 허균이 남해안보다 동해안의 김이 더 인상적이었다고 기록한 것은 그의 경험이 당시 사회적 상황과 닿아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주먹으로 김을 짰다는 것이다. 이것은 발장에 말려서 얇게 만든 김이 아니라 바다에서 채취한 김을 손으로 짜서 먹었다는 의미다. 허균 시대만 하더라도 김은 조정에 공물로 바치는 귀한 식재료였다. 그것을 일반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먹기는 어려웠다. 바닷가에 살면서 바위에 자생하는 김을 채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정에 올라오는 공물을 얻을 수 있거나 혹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집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조선 후기 유학자 윤증(尹拯, 1629~1714)이 1708년 2월 자신의 서제(庶弟)인 윤졸(尹拙)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서제가 선물로 보내온 김과 생전복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이 관청에서 얻은 것임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1650년(효종1) 3월 23일 자 왕조실록 기사에는 이경여(李敬輿, 1585~1657)가 조정에 공물로 바치는 김 1첩이 목면(木綿) 20필에 해당한다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백성들의 괴로움을 간언하는 내용이 나온다. 성인 남성의 군포가 1년에 2필 내외였음을 고려하면, 김값은 어마어마했다. 이처럼 18세기 초까지만 해도 김은 귀한 대접을 받았다.

‘광양시지’(2005)에 의하면 1640년 광양에서 김여익(金汝翼, 1606~1660)이 김을 양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해의’를 김이라고 부르게 된 연유를 김여익의 성을 따서 부르게 되었다는 속설도 생겨났겠는가. 이 기록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17세기 이후 김 양식이 본격적으로 되었으리라는 하나의 증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조선 전기 실록에는 중국이나 일본의 사신들에게 김을 선물로 준 기록이 다수 남아있는데, 많은 김을 요구하는 경우 물건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 그렇게 보면 17세기 이후 양식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김여익보다 앞선 시기를 살았던 허균 시대만 하더라도 김은 자연에서 채취한 것이었다. 지금도 돌김은 바위에서 채취하여 그것을 얇게 말리지 않고 둥글게 덩어리로 만든 뒤 김국을 끓여 먹는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보면 허균이 주먹으로 김을 짰다고 서술한 것은 국이나 무침으로 먹기 위한 음식 재료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먹을 때 김이 주는 특유의 향이라든지 푸른색의 아름다움, 부드러운 목 넘김 등을 총체적으로 즐기면서 김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다. 허균은 이런 방식으로 먹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