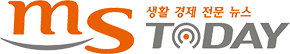근대 이전 한문의 전통에서는 복숭아꽃, 살구꽃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꽃이 오얏꽃이다. 웬만한 사람들은 쉽게 알아보는 한자 ‘리(李)’가 바로 그것이다. 도리(桃李)라고 할 때의 ‘리’다. 성씨로 널리 알려진 오얏꽃을 말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오얏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얏은 자두를 말한다. 이 정의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두의 넓은 범주를 생각하면 오얏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든 간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다.
허균의 시문에도 오얏으로서의 자두는 여러 차례 등장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문이 가진 관습적 표현의 범주에 있으므로 그가 오얏을 특별히 등장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그것은 복숭아꽃과 함께 ‘도리’로 병칭되면서 봄날의 한때를 장식하는 관용어로 사용되었거나 혹은 소인이나 간신배를 의미하는 정치적 우의로 사용되기 일쑤였다. 그런 점에서 오얏은 사람들의 곁에 늘 있었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풍경이나 의미를 형성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
그런 맥락에서 허균이 ‘도문대작’에서 ‘자도(紫桃)’ 즉 자두를 하나의 항목으로 설정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지역에서 두 개 이상의 이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각각의 사물을 구분하려는 사회적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르라 구분하는 기준도 존재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같은 지역 안에서 자두와 오얏이 모두 사용된다면 두 이름 사이에는 각각이 지칭하는 사물이 존재하리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허균이 ‘도문대작’에서 한시문에서 널리 사용되는 ‘오얏(李)’이라는 항목을 넣지 않고 ‘자두(紫桃)’라는 항목을 설정한 것은 둘 사이의 차이를 무의식중에 혹은 의식적으로 구별하는 태도는 아니었을까 싶다.
허균은 자두 항목을 이렇게 서술하였다. “자두[紫桃]. 삼척(三陟)과 울진(蔚珍)에서 많이 나는데 크기는 주먹만 하고 물기가 많다.”
삼척과 울진은 지금도 자두가 많이 자생하고 있거나 규모가 제법 큰 과수원도 있다. 기후 변화라든지 재배하는 작물의 변화와 함께 예전보다 많이 사라지기는 했어도 여전히 이 지역의 자두는 크고 맛이 있다. 자두를 ‘자도(紫桃)’라고 표기하는 것은 열매의 색깔이 자주색에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자두는 종자 개량이 되어 크면서도 단맛이 많은 열매로 품종이 바뀌어서 갔고, 색깔 역시 자주색 계통뿐만 아니라 노란색 계통도 두를 많이 재배되었다.

1970년대 삼척과 울진을 포함한 한반도 동해안 쪽으로는 자두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과수원이 많았는데, 노란색 계통의 자두도 상당량 생산되었다. 자두를 지칭하는 단어는 지역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자두 외에도 고야, 애추 등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내가 자란 동네에서는 ‘꽤’라고 부르는 자두나무가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웬만한 집 마당에는 한두 그루씩 자라고 있었으므로, 딱히 우리 집 ‘꽤나무’가 아니더라도 오가며 따먹곤 했다. 그만큼 흔한 나무였다.
그러나 과수원에서 재배하는 나무는 꽤나무가 아니라 자두나무라고 칭했는데, 그것은 품종을 생물학적 분류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감각적으로 구분하는 것이었다. 이 글을 쓰면서 내 기억에 왜곡이 있을까 싶어서 여러 군데 물어보았는데 흥미롭게도 열이면 열 모두 꽤나무와 자두나무를 감각적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아마도 개량된 품종으로 과수원에서 재배되는 달고 큰 것은 자두로 통칭하고 짙은 자줏빛 열매가 달리는 토종 자두는 꽤나무로 통칭하는 것 같았다. 꽤나무에 달리는 열매는 겉과 속이 모두 붉은빛에 가까운 짙은 자줏빛이고 크기 역시 대부분 작다(물론 그중에서도 큰 것은 상당히 크다). 완전히 익으면 살이 물러지면서 물이 많아지는데, 그것을 입에 넣고 몇 번 공 굴리면 살은 모두 열매즙과 함께 사라지고 씨만 남는다. 생물학적으로는 두 품종이 모두 자두 혹은 오얏에 속할지는 몰라도 지역민들의 감각 안에서는 같은 품종이되 세부적으로는 차이를 가지는 열매였던 것이다.
자두와 꽤의 차이를 길게 언급하는 이유는 허균이 ‘도문대작’의 항목을 ‘리(李, 오얏)’로 쓰지 않고 ‘자도(紫桃)’라고 표기한 것 때문이다. 오얏과 자두가 같은 품종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지만, 허균의 감각 안에서는 두 가지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대 이전 문헌에서 ‘자도’는 널리 사용되지 않았던 반면 오얏을 뜻하는 ‘리’는 상시적으로 사용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허균이 굳이 ‘리’를 표제어로 사용하지 않고 ‘자도’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 나름의 차이를 감각적으로 구분하고 있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아마도 ‘리’라는 한 글자보다는 녹리(綠李)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기도 했을 것이다. 녹리는 붉은 자두가 아니라 푸른 오얏이라는 뜻인데, 이는 앞서 언급한 노란 자두 계통을 지칭하는 것이다. 노란 자두를 보면 완전히 노랗다기보다는 푸른빛이 돌기 때문에 예로부터 녹리라고 불렀을 것이다. 녹리는 조선 시대 왕실에서부터 양반가에 이르기까지 제수로 널리 사용하였다. 1666년 8월에 건립된 이규령 묘비문은 이 시기 왕실 종친의 묘소에 있는 것인데, 그 안을 보면 수박, 앵두, 대추 등 여러 과일과 함께 녹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녹리라고 표기되는 오얏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여 허균은 자두를 따로 기록하였을 것이다.
더운 여름날 자두 하나를 따서 옷깃에 쓱쓱 문질러서 한 입 베어 물면 새콤달콤한 맛과 과즙이 입안에 고이면서 여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든다. 그가 특히 맛있는 자두로 기억하고 있는 삼척이라면 유배당하기 3년 전 삼척 부사로 발령을 받았다가 한 달도 안 되어 해직된 곳이 아니던가. 그렇지만 허균은 자신의 글 어디에서도 삼척을 부정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서해 쪽에 귀양을 간 몸이지만 마음속에서 동해는 늘 그리운 곳이었던 모양이다. 그리운 동해를 떠올리게 하는 자두를 기록하면서 새콤달콤한 기억으로 입안 가득 침이 고였을 것이다.